제사를 지내거나 상차리는데 있어 표준 원칙은?
이제 며칠있지 않으면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차례를 지내게 되는데요.
이 채널에서 그동안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순서나 상차리는 법,
지방쓰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번 알아본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제사순서나 상차리는데 적용되는
사자성어나 용어 등 표준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상차리는데 있어 표준 원칙은?
설명드리기전에 위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돌아가신분 위주가 아니고
우리가 보았을 때 위치라는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자반생자(死子反生者)
죽은 사람(死者)과 산 사람(生者)의 위치는 반대 방향이란 겁니다.
묘소의 합장시 서쪽은 선고(先考- 아버지).
동쪽에는 선비(先妣- 어머니)의 무덤을 선답니다.
신위(神位.지방)를 모실 때도 서쪽에 선고(先考-아버지).
동쪽에는 선비(先妣-어머니)의 신위를 모시죠.
살아계시는 부모님은 아버지께서 동쪽(어머니 오른쪽).
어머니께서 서쪽(아버지 왼쪽)에 자리합니다.
방금말한 돌아가신분과는 반대죠
물론 이때 오른쪽 왼쪽은 우리가 보았을 때 위치랍니다.
다시말해서 살아있는분의 상차림은 상을 받는 입장에서
앞을 보면 왼쪽에서부터 밥-국순이고요.
제사상의 상차림은 참사자가 보면 왼쪽부터 반-갱의 순으로 같은 모양이지만
신위가 상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왼쪽이 갱이고
오른쪽이 밥으로 산사람과 반대라는 걸 알수있죠.

▲좌서우동(左西右東)
신위(神位.지방)가 놓이는 방향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모셔도
모시는 곳이 항상 항상 북(北)쪽입니다.
따라서 산 자(生者)가 바라보아서 오른편이 東, 왼편이 西쪽이랍니다.
신위 쪽에서 보면 신위의 오른편이 서쪽이고 왼편이 동쪽이 되는데요.
이러한 혼돈을 막기위해 보통 참사자 위주로 방향을 말한답니다.
▲이서위상(以西爲上)
신위를 향해서 바라보아 西(左)쪽이 동쪽보다 상위(上位)입니다.
그래서 무덤도 선고(先考-아버님)를 서쪽에 모시고
선비(先妣-어머님)를 동쪽에 모신답니다.
그러나 지관에 따라 장소를 바꾸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수 있죠

▲남좌여우(男左女右)
무덤에 모실 때와 신위(지방)를 모실 때
남자조상은 西(左), 여자조상은 東(右)편에 모시는거죠
제사상의 반(밥). 갱(국)도 남좌여우(男左女右) 로 구분하여 진설합니다.
▲고서비동(考西妣東)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위인 고위(考位)와 어머니의 신위인 비위(妣位)를
합설 할 때 남자조상은 西(左)쪽에 여자조상은 東(右)쪽에 모신다는 것이죠.
좌서우동(左西右東)이니 남좌여우(男左女右)도 모두 산 자가
신위와 무덤을 바로 보았을 때 방향을 말하는 거구요.

▲음양조화(陰陽調和)
제사상에 제물을 진설시 첫 줄과 셋째 줄은 홀수,
둘째 줄과 넷째 줄은 짝수로 진설한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음양오행설에서 비롯한 만큼 이를 기본으로 진설한답니다.
제사 음식은 음양으로 구분하여 진설해야 하는데
흰색은 음이니 서쪽에 진설하고 붉은 색은 양이니 동쪽에 진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율시이'는 음식이라도 음양을 따지지 않고
'조율시이' 순서 그대로 진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죠
대추와 밤은 붉은색인데도 서쪽에 진설하니 붉은색은 동쪽에 진설해야 한다는 것과
배치된다는 것인데 조율시이는 다른 원칙에 우선하여 진설하는 것입니다.

▲시저지남(匙箸之南)
숟가락 잎(넓적한 부분)과 젓가락의 뾰족한 부분이
남쪽으로 향하도록 놓는다는 건데요.
당연히 이건 돌아가신분이 수저를 잡으니깐 그렇죠.
▲반서갱동(飯西羹東) . 좌반우갱(左飯右羹)
제사상 진설시 산 자(참사자)를 기준으로 바라보아 밥은 西(左),
국은 東(右)에 놓는다는 건데요.
이건 앞에서 말한 死子反生者(죽은 자는 산 자와 반대)와 같은 의미죠

▲반갱중시저(飯羹中匙箸)
제사상 진설시 반(메. 밥)과 갱(국) 중간에 수저를 놓는다는 의미인데요.
산사람은 본인이 봤을 때 왼쪽부터 밥,국,수저순으로 놓지만
돌아가신 분 한데는 신위기준으로 왼쪽부터 국,수저,밥순으로
살아계신분과 국과 밥은 반대이고 중간에 수저를 놓는겁니다
▲좌면우편(左麪右餠) /서면동편(西麪東餠)
국수(麪)는 왼쪽, 편(餠)은 오른쪽에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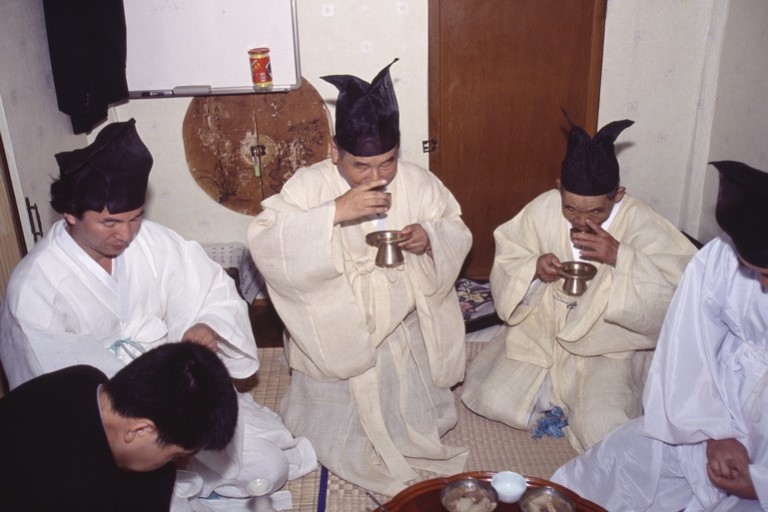
▲반중서병(飯中西柄)
참사자가 바라보아 숟가락(匙)은 움푹 파인 곳을 동쪽으로 가게 하여
메 중앙에 꽂는건데 신위의 주인이 밥을 떠서 잡수실 수 있도록
숟가락의 파인 곳을 동쪽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고비합설(考妣合設)
내외분일 경우 남자조상과 여자조상은 함께 차린다
▲천산양수(天産陽數)
자연에서 생산된 생과(生果)는 홀수 가지를 씁니다. 그 수도 홀수로 담구요.
양수(陽數)는 홀수를 말하고 음수(陰數)는 짝수를 말한답니다.

▲ 생동숙서(生東熟西)
날 것은 동쪽(오른쪽)에 익힌 것은 서쪽에 진설합니다.
산(生)것은 양(陽)이니 東, 익힌(熟)것은 음(陰)이니 西쪽입니다
▲좌포우혜(左脯右醯)
포(북어, 대구, 오징어포)는 왼쪽에 놓고
식혜(수정과 등 삭힌 음식)는 오른쪽에 놓습니다.
고기를 얇게 저미고 양념하여 말린 脯는 죽은 것이니
음(陰:西), 식혜(食醯)는 산 것이니 양(陽 :東)이랍니다.
▲건좌습우(乾左濕右)
마른 것은 西, 습한 것은 東쪽에 놓는다.

▲적전중앙(炙奠中央)/적전중앙(炙煎中央)
산적(散炙)은 제수 중심 음식으로 중앙에 놓는데요.
산적은 원래 술을 올릴 때마다 즉석에서 구워 올렸으나
지금은 미리 구워 제상(祭床) 한가운데에 놓는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고기구울 적자로 한자를 보면
적(炙) = 고기 육肉 + 불 화火로 이루어졌구요
어육(魚肉)을 양념하여 대꼬챙이에 끼어 구운 것이고 전(煎)은 지짐이를 말하죠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은 東, 육고기는 西쪽에 놓는다.

▲두동미서(頭東尾西)
머리는 東, 꼬리는 西를 향하게 놓는다.
지방과 가문에 따라 반대로 놓기도 한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죠
▲배복방향
닭구이와 생선포는 바르게 놓을 때는 등이 위로,
뉘어 놓을 때는 배가 조상(신위 방향)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어배향위(魚背向位),
물고기 등(背)이 神位(지방)를 향하게 한다.
▲홍동백서(紅東白西) :
붉은 과일은 東, 흰 과일은 西쪽에 놓는다.

▲조율시이(棗栗枾梨)
과일은 대추, 밤, 배, 감(곶감) 순으로 놓는다.
배와 감의 순서가 바뀌기도 한데요. 南人은 棗栗枾梨로 한답니다
철에 따라 사과, 수박, 포도 등도 놓으나 복숭아는 사용하지 않는건 아시죠.
말이 나온김에 예로부터 전해오는 과품육유(果品六有)는
조율이시행도(棗栗梨柿杏桃)라고 하여
대추. 밤. 배. 감. 은행. 복숭아 여섯 가지를 말한답니다.
▲반중서병(飯中西柄)
밥 가운데 숟가락을 꽂으며
나중에는 숭늉그릇에 숟가락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 놓는다는 거구요.
숟가락과 젓가락의 머리부분은 손으로 잡는 부분이 머리부분이구요.
숟가락은 넓은 부분이 꼬리부분이고 젓가락은 뾰족한 부분이 꼬리부분이죠.
그래서 시저(수저)를 고를 때는 머리부분인 손잡이가 서쪽으로 가도록 하고
꼬리부분이 동쪽으로 가도록 놓는데요.
이는 혼백이 시저(수저)를 잡을 때 바르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접동잔서(接東盞西)
접시는 東쪽, 잔은 西쪽에 놓는다.
▲도위하제사불용(桃爲下祭祀不用)
이말은 복숭아는 가장 아래 등위로 제사에는 쓰지 않는다는 건데요.
복숭아나무는 귀신을 쫓기 때문이랍니다.
▲타인지제 왈리왈시(他人之祭曰梨曰枾)
남의 제사에 배놓아라 감놓아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남의 제사에 이치를 따지거나 시비를 붙이는 것을 금기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사순서나 상차리는데 적용되는
사자성어나 용어 등 표준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예법만 아셔도 제사를 지내거나 상을 차리는데는 별 문제 없겠죠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전통예절 및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식이나 동생이 먼저죽거나 장례식장 상주가 손아래면 절을 해야하나? (3) | 2023.10.12 |
|---|---|
| 묘제(墓祭)의 유래와 시기, 절차, 지역별 특징은? (4) | 2023.09.27 |
| 종중과 문중의 차이점과 종친회,문회,유복친,가문등은? (1) | 2023.09.14 |
| 항렬이나 서열은 높으나 나이가 적을 경우 예우와 호칭법 (2) | 2023.09.10 |
| 혼인에서 서약하는 삼서정신과 평등정신, 결혼 혼인 혼례중 맞는 말은? (4)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