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아들딸등 가족간의 햇갈리는 호칭 정리
제가 좀 젊었을때의 일입니다. 친구와 술한잔을 하면서
그 친구가 “선친 8순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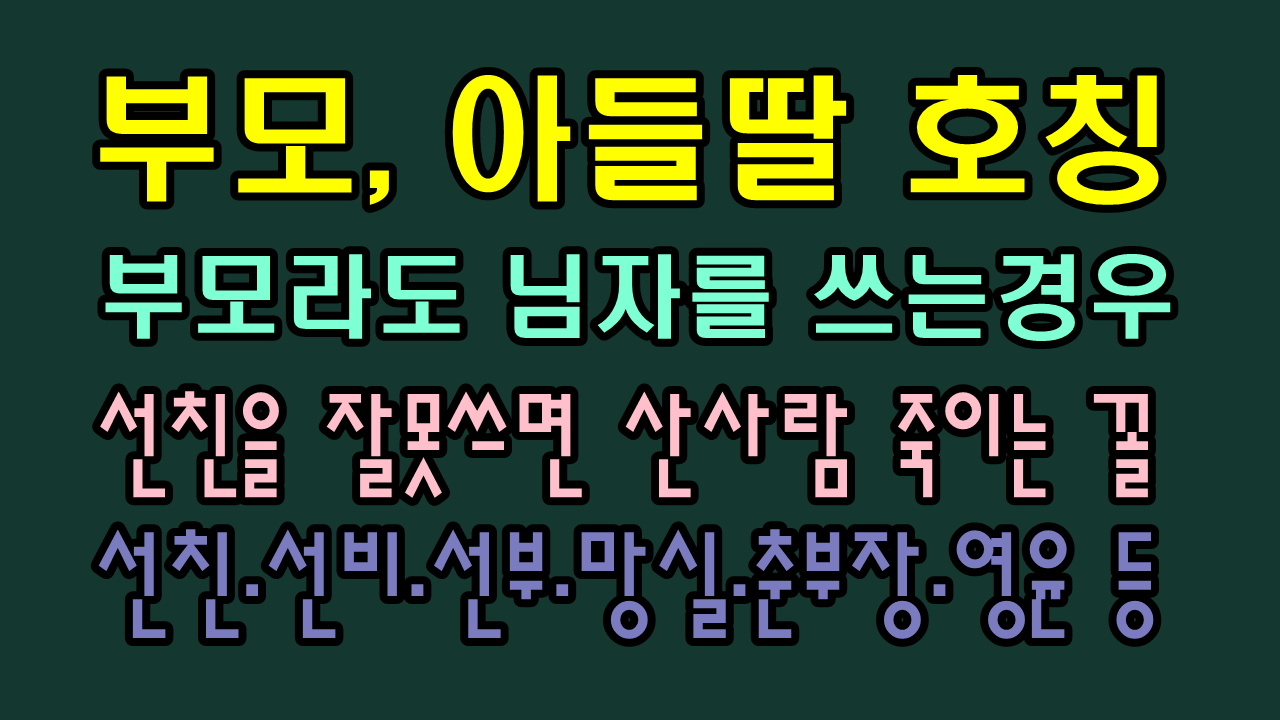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연락도 안하냐니까
그친구가 나를 보면서 무슨소리냐 얼마안있으면 8순인데
돌아가시기는 왜 돌아가셔~ 하는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문식의 호칭인 선친이란 말을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인줄 알고
잘못 사용한 결과로 빚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잘 모르면 그냥 요즘 많이 사용하는 아버지라면 될텐데
굳이 한문식 호칭을 사용하다 보니 이런 착오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부모와 아들딸등 가족간의 햇갈리는 호칭 정리
그렇다면 호칭과 지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할까요
호칭이란 어떤 사람을 직접 부르는 말이고. 지칭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말 할 때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 라 하는 것은 다 아시죠.
이는 아버지와 자식사이에는 공경하는 예(禮)스러움 보다 친(親)함이 앞서기 때문에
‘님’자를 붙여 예를 앞세우지 않고 친함을 앞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분이
아니므로 ‘님’을 붙여 아버님, 어머님 이라 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며느리, 사위 할것없이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호칭법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친정아버지는 오늘 이런저런 내용을 아버님께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말하는게 정확한 사용법이랍니다
그리고 아빠라는 표현은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까지 쓰는 말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법이 그렇다는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와서는 자식이 결혼을 하더라도 아빠라고 부르는게 대다수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지 역행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국립국어원 《표준언어예절 2011》에도 시대의 상황을 감안하여
어릴 때만 엄마 아빠를 쓰도록 하였던 것을 장성한 후에도
격식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는 ‘엄마’‘아빠’를 쓸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라도 님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편지나 글로 쓸 때는 ‘님’을 붙여 아버님, 어머님이라 하는게 맞답니다.
아버님께 올립니다, 어머님께 올리나이다 등이 되겠죠
또 기제사나 명절 차례의 경우 지방이나 축문을
한글로 쓸 때도 아버님 어머님 이라 한답니다
지방이나 축문을 한글로 쓸때보면 아버님신위 (顯考學生府君神位),
어머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등이 되겠죠

제사 지낼 때 지방에 현고(顯考), 현비(顯妣)라 쓰는데 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이고
비(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은 다 아시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님, 선친(先親),
선고(先考), 선부(先父), 선부군(先父君), 선군(先君)이라 하고,
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님, 또는 선비(先妣), 선자, 선자친이라 합니다.
또, 죽은 남편이라면 별세한(죽은) 남편(지아비), 선부(先夫), 망부(亡夫),
망군(亡君)등을 쓰고 죽은 아내는 별세한(죽은) 아내(지어미), 망실(亡室), 망처(亡妻)라 합니다
이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죽은 아들이라면 죽은 아들, 망식(亡息), 망자(亡子)
죽은 딸은 죽은 딸, 망식(亡息)이라 하고 죽은 딸이라도 망녀(亡女)로는 쓰지 않는답니다.

죽은 형 : 별세한(죽은) 형님, 선형(先兄), 망형(亡兄), 선백형(先伯兄, 별세한 큰형님)
죽은 동생은 죽은 아우, 망제(亡弟)
죽은 누이는 죽은 누님(누이), 망매(亡妹)
별세한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시아버님, 선구(先舅),
별세한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어머님, 선고(先姑),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부모의 제사에 한문식 축문을 쓸 때 제사를 받드는
이가 큰아들인 경우 효자○○감소고우(孝子○○敢昭告于)라 쓰는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효자는 효도한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여기서 효자라는 말은 효도라는 의미의 효자가 아니고
제사 지낼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 즉 맏아들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사정이 있어 작은 아들이 주인이 되어 제사를 지낼 때는
효자(孝子)를 쓰지 않고 그냥 자(子)라고만 씁니다< 자○○감소고우 >
또, 상장례 때 축문 인사장 등에 아들을

표시할 경우,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고자((孤子)라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애자(哀子)라 하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 가셨으면 고애자(孤哀子)라 합니다.
부모와 아들딸등 가족간의 햇갈리는 호칭 정리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도 많이 어렵죠,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는 저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하고 한문식으로는 가친(家親)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아버지께 직접 말할 때 그저 아버님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데
이는 크게 혼동이 오는 호칭이랍니다.
이때는 아버님이라 하지않고 어르신, 어르신네라 해야 합니다
어르신은 남녀 구분 없이 쓰는 말이니깐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신........이렇게 말을 이어가야 합니다
남에게 그의 아버지를 말할 때는 ○○아버님, 자네아버님, 자네어른, 댁의 아버님,
선생님의 아버님이라 하는건 별로 햇갈리지 않죠. < 자네 아버님은 안녕 하신가? >
만약 상대방과 대화중일때는 제3의 아버지를 말할 때 ○○의 아버님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유념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부모를 말할 때는 부친, 모친이라 합니다.
한문식으로 말하면 남의 아버지는 춘부장(椿府丈,春府丈)이고
남의 어머니는 자당, ○○의 자당이라 부르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한글식으로 사용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절이 가장 중요시되는때가 장례식때라고 했죠.
상대방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돌아가신 아버님, 선대인(先大人),
선고장(先考丈), 선부군(先父君)이라 하고 어머니일 경우에는
돌아가신 어머님, 선대부인(先大夫人), 선자당(先慈堂)이라 합니다

부모와 아들딸등 가족간의 햇갈리는 호칭 정리
그리고 살아 계신 자기어머니에 대한 고유명사는 자친(慈親)이죠.
모(母)보다 사랑하다 어여뻐하다의 뜻을 가진 자(慈)를 쓰는 까닭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기리기 위한 옛 사람의 뜻으로
나를 어여뻐 하시는 어버이랍니다.
미혼인 자녀는 이름을 부르거나 너, 애야, 몇째야 하고 부르지만
기혼인 자녀에게는는 아범, 어멈, ○○애비, ○○어미, ○실,
<예>: 남편의 성 김 을 붙여 김실. 아이까지 낳은 자식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둔 아들을 그 아내나 자녀들에게 말할 때 애비라 하고, 자녀를 둔 딸을
그 남편이나 자녀에게 말할 때나 며느리를 직접 부르거나
자녀에게 말할 때 애미라 하죠.
남의 아들딸을 그 부모에게 말할 때는 아드님, 큰아드님, 따님이라 하구요.
한문식으로 말하면 아드님은 영식(令息)이고 따님은 영애(令愛)랍니다.
남의 부인을 높여서 영부인(令夫人)이라 하죠.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딸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영윤(令胤)은 댁의 큰(맏)아드님이란 뜻이고요.
남의 아들을 예스럽게 하려면 ○○의 자제라 합니다
우리가 글로 쓸 때 아들 ○○올림을 한문식으로는 불초자 또는 소자라 쓰고요.
저의 아들을 한문식으로는 가아(家兒)라 합니다.

부모와 아들딸등 가족간의 햇갈리는 호칭 정리
어때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지만 많이 어렵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어려운 한문호칭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살아계시는 분을
돌아가신분으로 둔갑시키지는 말아야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전통예절 및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사도 이제는 장남이나, 장손, 아들만이 주재하는게 아니다! (3) | 2023.05.17 |
|---|---|
| 돌아가신후 꼭 챙겨야 한다는 첫번째 생일, 생신제? (2) | 2023.05.15 |
| 아버님 성함이 홍자 길자 동자라면 안되죠? 무엇이 잘못일까? (4) | 2023.05.08 |
| 제사시간을 바꿔서 초저녁에 지내도 되나요? (2) | 2023.05.02 |
| 제사상에 올리는 떡과 올리지 말아야 하는 떡... (3) | 2023.04.26 |